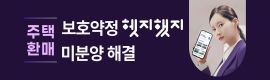2026년의 풍경: 제국의 시대·혁신의 시대·초양극화의 시대

본 제목은 영국의 사회학자 에릭 홉스봄(1917-2012)의 저작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제국의 시대
새해를 맞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그 한복판에서 미국발 국제질서 변화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관세 정책으로 국제교역의 프레임을 흔들더니, 이제는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보다 노골적인 행보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보호무역, 자원 확보를 위한 군사력 동원, 지정학적 우위 선점을 위한 영토 확장 시도는 ‘MAGA’를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포장되지만, 그 궤적은 분명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질서와 충돌한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전제로 작동해온 전후 체제에서 미국은 더 이상 질서의 관리자라기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제국적 행위자로 돌아가고 있다. 인류의 갈등과 대립, 통합과 연대가 언제나 시대적 조건의 산물이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질서를 가능하게 했던 이면의 조건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을 단순히 “왜 하필 트럼프인가”라는 개인의 돌발성과 특수성으로 환원하는 해석은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는 우연한 사고라기보다 선택된 결과에 가깝다. 그를 선택한 미국 사회의 지향과 기류, 그리고 그러한 기류를 축적해 온 전후 세계질서의 진화 양상이 사회적·역사적 추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요약하면 지금의 세계질서 변화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후 질서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갈등 에너지가 한 인물을 매개로 폭발한 결과에 가깝다. 그리고 제국의 시대가 다시 열릴 때, 국가는 힘과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혁신의 시대
제국의 논리가 부활하는 한편, 기술의 영역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등장한 로봇은 ‘거의 사람과 같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을 내재한 로봇이 인간 생활의 곳곳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공상과학의 영역을 벗어났다. 물리적 힘이 요구되는 생산 현장은 물론, 정밀성과 반복이 핵심인 작업 영역까지 로봇과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AI 혁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를 두고 긍정과 부정, 득과 실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도로서 AI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둘러싼 규제 논의 역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AI 변화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대세적 지향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이제 문제는 ‘AI를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AI를 전제로 한 사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막대한 전력,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를 처리할 기초 연산 유닛으로서의 반도체다. AI 활용이 확산될수록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다시 산업과 자본의 공간적 재편을 촉발한다. 혁신의 시대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와 인프라, 그리고 공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초양극화의 시대
제국의 기시감과 혁신의 속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불편한 단면은 초양극화다. 전년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한 반도체 기업에서 인센티브가 연봉의 50%에 달했다는 기사는 초양극화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가 5000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전체 상장 종목의 66%가 하락했다는 사실은, 성장의 과실이 점점 소수의 초대형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지 기업 실적이나 소득 격차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은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그 성과를 고르게 분배하지 않는다. 기술과 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확대된다. 초양극화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자산시장에서도 이 양상은 뚜렷하다. 상급지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선다. 제국의 불안과 혁신의 속도가 만들어낸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과 개인은 가장 확실해 보이는 저장 수단을 선택한다. 서울의 핵심 부동산은 그 선택의 종착지다.
결국 초양극화의 시대에 부동산 가격은 호황의 신호라기보다 불안의 지표에 가깝다. 제국의 시대가 힘을, 혁신의 시대가 속도를 상징한다면, 초양극화의 시대는 그 대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